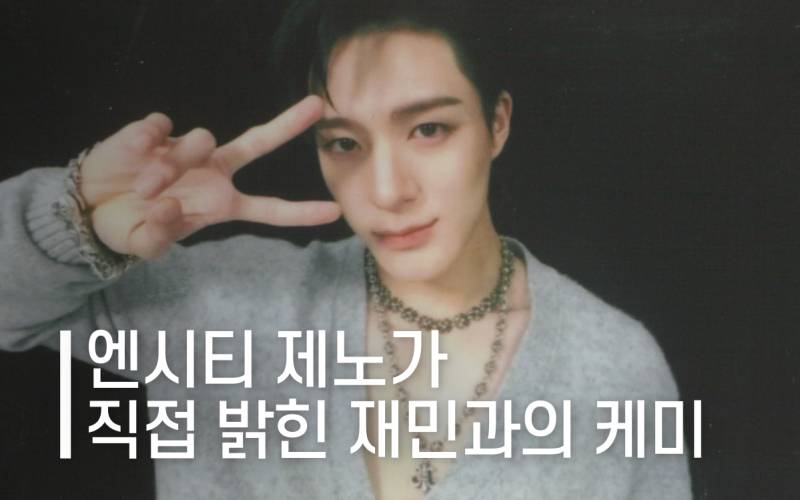두쫀쿠가 프랜시스 베이컨과 파블로 피카소, 데이비드 린치의 식사법에 미치는 영향
창작자의 식사법에 대한 중얼거림.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네가 먹는 것이 곧 너다(what you eat is what you are)
19세기 프랑스 미식가 브리야사바랭의 책에서 시작된 이 문장은 식습관이 건강과 체형은 물론 성격과 삶의 질까지 좌우한다는 의미로 소비되어 왔다. 하지만 창작자의 세계에서 이 문장은 조금 다르게 읽힌다. 그곳에서 먹는 행위는 단순 영양학적으로 분석될 수 없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감각의 농도와 사고의 온도가 달라지고, 그 변화는 작업 전반에 은근히, 그러나 거세게 스며든다. 늘 배고픈 창작자에게 저당, 제로 슈가, 두쫀쿠의 유행은 세계를 어지럽히고 통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해꾼에 불과하다. 그리고 고자극 도파민의 시대를 버텨내기 바쁜 그들의 집중력은 사소한 방해에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
창작자의 작업실을 떠올리면 늘 비슷한 장면이 그려진다. 지저분한 책상 위에 쌓인 종이들, 마르지 않은 물감 자국, 재떨이에 눌러 담긴 담배꽁초, 그리고 끝내 다 마시지 못한 블랙 커피. 그곳에서 음식은 늘 부차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먹는 방식은 사고 방식의 연장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같은 음식만 집요하게 반복했고, 어떤 이는 거의 먹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는 음식 그 자체를 작업의 일부로 삼았다.

로베르 두아노, <Les Pains de Picasso>
파블로 피카소는 식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었다. 그는 종종 빵과 치즈, 와인처럼 단순한 음식만으로 하루를 버텼다. 오늘날로 치면 라면에 김치를 곁들이고 소주 한 잔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정도의 태도겠지. 식사는 그에게 연료에 가까웠다. 피카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다시 붓을 들 것인가’였다. 자연히 식사는 최소화된다. 남은 에너지는 온전히 창작에 쏟아 붓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형태를 해체한 뒤, 끝내 본질만 남겼다.

프랜시스 베이컨, <비명 지르는 피사체>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피카소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라면과 김치, 소주 따위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식탁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려면 그의 그림을 떠올리면 된다. 1944년작 <십자가 아래 형상을 위한 세 개의 습작>에서 보이는 뒤틀린 존재들처럼, 베이컨의 세계에는 언제나 날것의 육체와 불안이 놓여 있었다. 그의 인물들은 고통을 견디고, 찌그러지고, 압박받는다. 존엄보다는 물성에 가깝고, 서사보다는 반응에 가깝다. 베이컨은 아침나절부터 술을 마셨고, 밤에는 친구들과 모여 육류 위주의 무거운 식사를 반복했다. 스테이크, 고기, 녹진한 소스… 프레쉬하고 균형 잡힌 식사는 그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에게 음식은 육체를 각성시키고 극단적인 감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도구였다. 날것의 고기를 씹는 행위, 술로 흐릿해진 감각, 과식 이후 찾아오는 둔중함. 인간은 이름을 따라간다더니, 그의 세계는 늘 살코기와 불안 어디쯤을 맴돌고 있었다.
피카소가 식사를 최소화하며 에너지를 화면에 집중했다면, 베이컨은 오히려 육체를 과도한 상태로 몰아넣음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다. 절제와 과잉. 두 창작자의 식탁은 그들의 회화 만큼이나 선명하게 갈린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피카소 보다는 베이컨 쪽의 사람이다. 배부른 상태의 무거운 몸, 약간 흐릿해진 감각 속에서 오히려 생각이 풀리는 경험을 즐긴다. 좋은 식습관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창작자에게 먹는 방식은 취향이 아니라 사고를 작동시키는 조건이라는 점이다. 누구는 비워야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채워야 비로소 움직인다.

데이비드 린치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나쁜 커피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컬트 영화의 거장 데이비드 린치 감독은 40여 년간 초월명상을 자신의 작업 방식으로 삼아왔다. 그는 명상을 아이디어의 원천이자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통로라 말한다. 토마토, 참치, 페타치즈, 올리브오일이 그가 즐기는 런치의 점부다. 메뉴는 단순하고, 선택지는 없다. 그리고 이 반복을 통해 삶의 변수를 최소화했고, 어디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다 말한다. 그에게는 식사 또한 일종의 명상이었던 셈이다. 린치는 베이컨처럼 육체를 밀어 붙이지도, 피카소처럼 모든 것을 덜어 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의식을 정렬하는 방식을 택했다. 40여 년 간 실천해온 초월명상, 하루에도 몇 잔씩 반복되는 커피, 거의 의식에 가까운 루틴. 린치에게 식습관과 명상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창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리듬이다. 과연 린치가 일관된 식사생활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훌륭한 영화들이 탄생 못했을까?
작년 이 맘때쯤이었다. 노른자가 줄줄 흐르는 계란후라이를 먹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별세 소식을 접했다. 들기름을 살짝 끼얹은 노른자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날만큼은 끝까지 음미하기가 어려웠다. 음식은 입안에 남았고, 뉴스는 생각을 오래 붙잡았다. 이후로도 들기름 계란후라이는 여러 번 식탁에 올랐다. 노른자는 여전히 잘 흘렀고, 맛은 늘 비슷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일 년이 흘렀다. 지난주, 고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1주기를 맞아 CGV 기획전으로 <엘리펀트 맨> 4K 리마스터링을 다시 보았다. 배는 고팠지만 팝콘은 사지 않았다. 린치가 창작자로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영화를 보며 팝콘을 씹는 일은, 왠지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영관에서 크게 소리지르는 행위와 비슷해 보였다. 그날 내가 택한 것은 거창한 추모가 아니라 그저 팝콘을 사지 않는 정도의 조용한 예의였다.
Credit
- WRITER 류경진
MONTHLY CELEB
#카리나, #송종원, #채종협, #롱샷, #아이들, #제노, #재민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