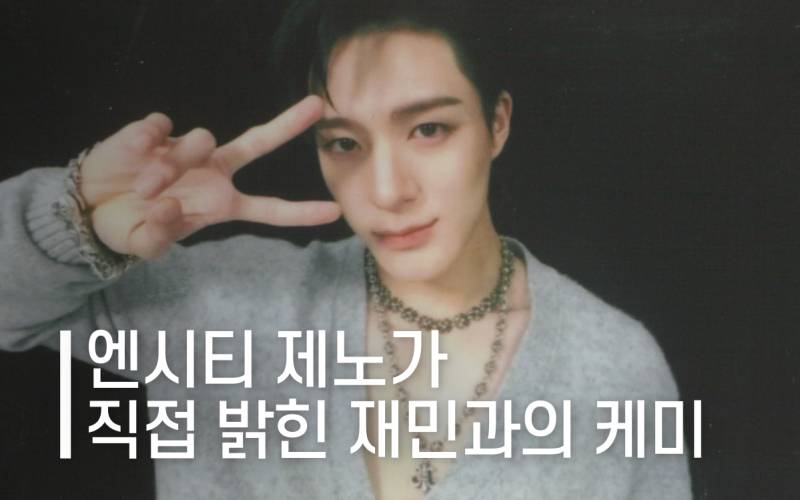뉴욕에 살면서 한국의 해산물을 늘 그리워하다
한국의 해산물 선진국이다. 특히 날것으로 먹는 데는 쫓아올 나라가 없다.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얼마 전 뉴욕의 해산물 요리로 잘 알려진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서 생선 요리를 먹었다. 이 레스토랑은 평소 아끼는 곳이라 매년 기념할 일이 있을 때 찾는다. 그런데 그날 나온 생선 요리에서 아주 미세하게 비린 맛이 스쳐갔다.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이라는 곳에서도 종종 이런 일을 겪게 된다. 딱히 내가 대단히 예민한 미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평소 해산물을 좋아하거나 비린내에 예민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매니저를 불러서 컴플레인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 정도의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해산물의 선도를 의심할 생각은 없다. 컴플레인을 해도 아마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조차 못 할 것이다. 레몬즙만 조금 뿌려도 금세 잡힐 수 있는 정말 미세한 비린내였으니까. 하지만 평소 날로 먹어도 되는 정도 선도의 식재료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의 출신 해산물 애호가라면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치즈를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프랑스 사람이 회색과 초록색 곰팡이로 덮인 블루치즈에서 미묘하게 쓴맛을 내는 다른 곰팡이의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여기에 비릿한 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20대에 바닷가 도시 몇 군데에서 산 적이 있다. 동해, 서해 그리고 남해를 한번씩 돌아가며 1년을 꽉 채우고 모든 계절을 겪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어지간한 항구도시들은 다 한 번씩 다녔다. 워낙 해산물을 좋아했지만 도시에 살다가 실제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직접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해보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다. 시장에 꾸준히 가면 제철 해산물이 뭐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지금도 사실 바닷가 도시에 10년 넘게 살고 있다. 종종 나 스스로도 잊고 사는데 뉴욕은 사실 바닷가 도시다. 맨해튼 섬 동쪽으로 흐르는 이스트 리버(East River)는 ‘강(River)’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바다다. 이스트 리버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발원지에 닿는 것이 아니라 롱아일랜드의 북쪽 바다와 만난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스트 리버를 본다. 그런데 왜 바닷가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할까? 그건 뉴욕마저도 해산물 선진국 출신 이민자가 바닷가 도시에 응당 바라는 해산물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변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의아해하며 “뉴욕에서 먹는 해산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미국 어느 곳에 가도 만족할 수 없을걸?”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그렇다. 어딜 가도 만족스럽지 않다. 뉴올리언스의 굴구이와 시푸드 보일(Seafood Boil)이나 보스턴의 로브스터 롤(Lobster Roll)이나 볼티모어의 크랩 케이크(Crab Cake)로는 채워지지 않는 해산물에 대한 허기가 있다. 계절감이 분명한 생선과 조개, 갑각류를 선도 걱정 없이 쓰고 싶다는, 똑같은 광어라도 산지, 자연산과 양식, 생선의 길이 또는 폭, 계절에 따른 미묘한 차이들을 즐기고 싶다는 허기가 있다.
사실 어쩌면 바닷가 도시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식재료의 선도를 결정하는 것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유통이다. 미국의 해안가 도시 뉴욕보다 대한민국 내륙에 있는 대구광역시에서 훨씬 더 다양하고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유통이다. 뉴욕의 상징적인 레스토랑 고담 바 앤 그릴(Gotham Bar and Grill)이 날로 먹어도 되는 선도의 참치 타르타르를 메뉴에 올릴 수 있었던 게 고작 1980년대 후반이다. 2000년대 들어서까지도 맨해튼의 스시집들은 고급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츠키지 시장에서 생선을 비행기로 공수해야 했다. 지금도 뉴욕 스시집의 네타는 다 거기서 거기다. 해산물을 날로 먹는 얘기를 하자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서울에서 보내는 연말이 더 기대된다. 겨울은 해산물의 맛이 깊어지는 계절이다. 동면을 준비하는 반달가슴곰 같은 마음으로 뉴욕에 돌아오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해산물을 먹어놓겠다고 다짐한다. 푸짐한 한국식 활어 횟집도 좋고, 다양한 선어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이자카야의 모둠 사시미도 좋다. 누가 당첨될지 모른다는 러시안 ‘굴렛’도 각오하고 있다. 몰트 위스키를 뿌려 먹으면 소독이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비과학마저 믿고 싶다. 꼭 생굴 아니더라도 굴튀김에 차가운 맥주면 충분하다. 대게나 킹크랩 같은 갑각류를 무제한 먹을 수 있다는 해산물 뷔페도 일단 체크. 무제한 메뉴를 만든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서울에서 먹기 힘든 쥐치, 쏨뱅이, 고랑치 같은 자연산 어종을 통영에서 수시로 공수한다는 횟집을 릴스에서 보고 저장해둔다. 벵에돔을 서울에서 먹을 수만 있다면 인플루언서 바이럴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겨울이 제철인 생물 대구 큰 놈을 하나 구하면 회로도 먹고, 전도 부치고, 지리도 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으니 같이 먹어줄 친구들을 수소문한다. 홍어도 과메기도 맛있어지는 계절이다. 올해는 새조개를 먹고 갈 수 있을까? 새조개는 늦겨울이 되어야 나오는 탓에 마음이 초조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자주 다니는 지인에게 수시로 새조개의 안부를 묻는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귀국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중곡동의 작은 이자카야에서 가볍게 저녁을 먹었다. 제철 삼치와 방어가 포함된 모둠회 접시가 나왔다. 방어 뱃살의 기름이 훌륭했다.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방어는 과대평가된 생선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이 넉넉하게 오른 뱃살 쪽을 도톰하게 썰어 혈합육을 다 제거하고 딱 세 점 정도 먹으면 충분하다. 오히려 겨울의 계절감이 제대로 느껴지는 생선은 삼치회였다. 처음 삼치회를 먹어본 여수 여행도 겨울이었다. 언 삼치회를 김에 싸 먹으면서 참치가 부럽지 않다고 생각했다. 삼치가 제2의 방어가 될 수 있을까? 겨울 삼치회 맛있다는 건 왠지 소문내고 싶지 않다. 박고지를 말아 만든 마키에 제철을 맞은 아귀 간을 올려 한입에 먹었다. 대체 이 못생긴 생선의 간을 처음으로 먹어보겠다고 도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웠는데 ‘서비스’로 도루묵구이가 나왔다. 겨울이 되면 알을 밴 도루묵이 제철이니 해산물을 좀 잘한다는 식당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메뉴다. 그런데 익힘의 정도가 너무 절묘했다. 도루묵 알을 감싸는 알집의 점액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알은 불투명하게 익은 바로 직후의 상태. 덜 구워졌다고 돌려보낼 수도 있을 만큼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요리사의 의도가 들어간 익힘이었다. 생선의 알은 과도하게 익히면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퍽퍽한 식감이 생긴다. 명태나 도루묵 같은 생선의 알을 퍽퍽하지 않게 먹으려면 낮은 온도에서 덜 익히는 수밖에 없다. 익혀야 하지만 익히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먹어본 최고의 멘타이코야키 역시 겉부분을 살짝 태우듯 익히고 명란 안쪽은 차갑지만 않게, 살짝 따뜻하게 데워진 완벽한 미디엄 레어 상태였다. 도루묵 알은 고소했고 살에서는 단맛이 났다. 선도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느낀다. 어떻게 이런 음식이 아무렇지 않게 툭하고 서비스로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미친 선도의 해산물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해물 선진국의 위엄이다.
도루묵구이 하나로 뭔 호들갑이냐고 하겠지만 이 정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중위도 지역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3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물론 뉴욕에서도 최고급 스시집에 가면(너무 비싸서 가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급끼리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보통의 일상은 최고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진짜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은 그 나라의 부가 집중되는 밀라노, 도쿄, 파리 같은 대도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이나 이탈리아의 작은 지방 도시들의 생활 수준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부를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최고급 화장실은 전 세계 어느 도시나 비슷하다. 하지만 일본을 ‘화장실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일본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평범한 화장실도 비데를 갖추고 일정 수준의 청결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불특정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함이 그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해산물 요리는 무엇일까? 동네 배달 횟집이나 마트에서 파는 광어회 정도가 아닐까? 이런 곳이 해산물 선진국 아니라면 대체 어디가 선진국이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최애 생선 이상형 월드컵’을 했다. 최종 후보에 붉바리와 긴꼬리벵에돔이 올라갔다. 나의 선택은 긴꼬리벵에돔이었다. 맛도 맛이지만 긴꼬리벵에돔의 미끈한 유선형과 파란색과 초록색의 미묘한 그라데이션, 보석 같은 검은 눈을 좋아한다. 외모지상주의는 생선도 피해 갈 수 없다. 루키즘(lookism)이라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고급 어종을 과감하게 조림으로 먹는 제주도 사람들의 사치스러움을 동경한다. 얼핏 보면 크게 다를 것 없는 생선을 굳이 벵에돔과 긴꼬리벵에돔으로 구분하는 박물학적 집착을 사랑한다. 이미 해산물을 먹고 있으면서 쉬지 않고 해산물 먹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대화가 늘 그립다. 프랑스의 19세기 살롱이 부럽지 않다. 이쯤 되면 해산물 선진국의 살롱 문화라고 할 법하다.
다시 뉴욕에 돌아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다. 메모해놓은 식당 중에 반이나 가볼 수 있을까? 먹겠다고 적어놓은 제철 해산물 리스트가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 있다. 뉴욕에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삶의 질이 134% 정도 상승할 것이다. 노량진은 너무 큰 욕심일까? 어느 동네에나 있는 영혼 없는 광어 배달 횟집이라도 뉴욕에 하나 업어가고 싶다. 이것이 선진 문물이라고 널리 알리고 싶다. 다 부질없는 상상이지만.
신현호는 뉴욕의 다국적기업 본사에서 전략 부문 업무를 한다. 스스로 “주 40시간은 회사에서 가격과 가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 80시간은 레스토랑을 다니고 요리를 한다”고 말할 만큼 미식을 즐긴다.
Credit
- EDITOR 박세회
- WRITER 신현호
- ILLUSTRATOR MYCDAYS
- ART DESIGNER 주정화
MONTHLY CELEB
#카리나, #송종원, #채종협, #롱샷, #아이들, #제노, #재민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