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웹소설의 개연성을 따지고 싶은 당신에게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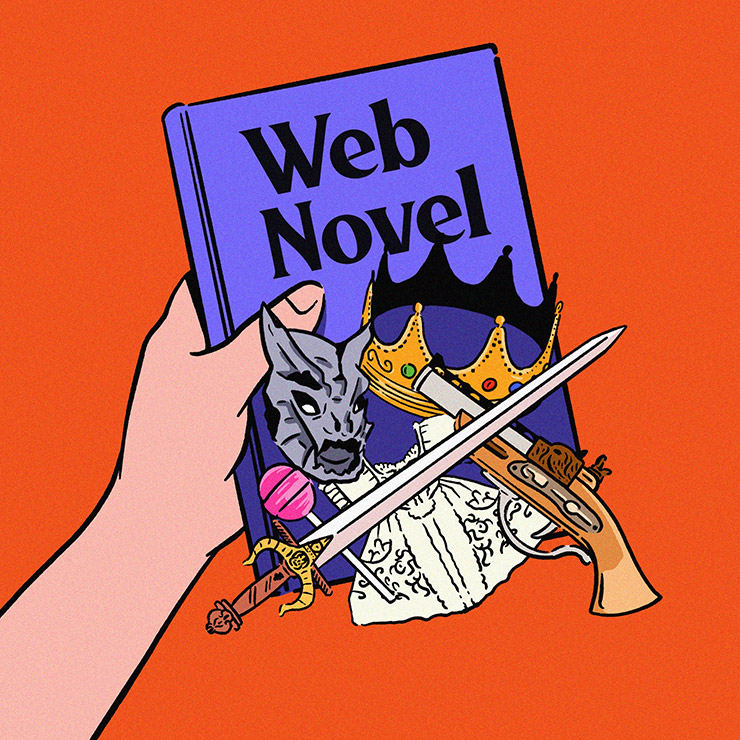
사회엔 웹소설에 대한 편견이 참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보자.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한창 이슈일 때, 각종 신문에서 너도나도 ‘웹소설은 MZ세대의 욕망을 다루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틀렸다. ‘재벌집 막내아들’이 처음 연재되었던 문피아를 컴퓨터로 접속하면 구매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MZ세대의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10대 독자 비중은 5%, 20대 독자 비중은 19%에 불과하며 이는 40대 26%에 못 미치는 수치다. 심지어 10대 독자 비중은 50대 이상의 독자 비중인 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전후기 밀레니얼 세대인 30대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웹소설을 MZ세대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긴 애매하다.
그럼 왜 사람들은 웹소설을 젊은 세대들의 욕망이라고 생각할까. 그것은 ‘장르문학’과 ‘웹소설’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웹소설’은 스마트폰을 통해 소설을 읽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학술 용어로는 매체라고 부른다. ‘장르문학’은 그 웹소설이라는 형태로 거래되는 내용물이다. 장르문학은 빅토리아 시대를 전후한 근대부터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그것이 종이책으로 유통되느냐, 컴퓨터를 통해 유통되느냐, 스마트폰으로 유통되느냐의 차이만 존재했을 뿐이다.
한국에서 대중 장르문학의 역사는 근대부터 시작한다. 무협소설 <정협지>가 김광주의 번안으로 신문 연재된 것이 1960년대의 일이다. 무협지 같은 장편소설의 독해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 보니 보통 12~15세 정도에 무협지를 접하게 된다. 그 말인즉 한국에서 무협지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1940~1950년대에 태어난 어르신들이란 소리다. 실제로 웹소설 플랫폼 댓글란에서는 “내 나이 70 먹을 때까지 무협을 읽어왔지만 이따위 글은 처음 본다!”라는 어르신들의 일갈을 쉽게 볼 수 있다. 떠올려보면 주변에서 <영웅문> 같은 무협지 한 권 안 읽어본 어르신을 찾기 힘들다. 가장 젊은 편에 속하는 판타지인 <퇴마록>이나 <드래곤 라자>가 나온 게 1990년대이니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처럼 웹소설을 소비하는 방식인 ‘스마트폰’만 젊을 뿐, 그 안의 내용은 나이를 훌쩍 먹었다. 사람들은 언어와 종이 그리고 소설의 발명 이후 수백 년 동안 종이책만으로 소설을 읽어왔기에 스마트폰이 소설의 내용과 완성도에 영향을 어떻게 주었는지 잘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 때문에 수많은 편견이 발생하는 것이다.
요새 자주 접하는 편견 하나가 더 있다. 웹소설 원작 드라마나 웹소설 원작 영화 등이 화제가 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로, 웹소설은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낮고 엉성하다는 지적이다. 이 이야길 내가 처음 들은 건 2018년 정도의 일이다. 그해, 한 동영상 플랫폼이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며 오리지널 드라마를 론칭하기 위해 웹소설 하나를 각색했다. 그런데 그 각색의 정도가 심해 주인공의 성별부터 등장인물, 이야기의 진행 등 모든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원작 드라마를 가져가 각색을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다.
이러한 불만을 가볍게 SNS에 올렸더니 각색을 담당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참전해 댓글을 남겼다. 흔히 말하는 ‘회귀, 빙의, 환생’ 같은 치트키를 가진 주인공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각자의 톤 앤 매너가 있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신을 통해 재연하기엔 ‘극적 아이러니’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써놓고 보니 <재벌집 막내아들>의 논란이 된 마지막 엔딩이 떠오른다. 사람들은 진도준이 회귀해 순양그룹을 손에 넣은 과정을 ‘완성’으로 인식했는데, 드라마를 제작한 사람들은 진도준을 결국 다시 현실로 되돌리는 것을 개연성 있는 ‘완성’으로 봤다. 웹소설이 아닌 일반적인 극의 문법을 따른 결말은 맹렬한 비판을 마주해야 했다.
아이러니나 극적 개연성, 서사적 완결성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다. 당연히 영화와 드라마의 완성도에는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웹소설이 영화나 드라마의 완성도를 기준에 놓고 따라가야만 하는 걸까?
웹소설의 개연성이 부족하고 내용이 단순해 보이는 건 웹소설이 하루에 한 편 정도로 편당 결제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웹소설은 5000자 내외의 소설이 24시간에 한 편씩 업로드된다.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300p짜리 소설책 한 권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시간 정도다. 당신이 끝내주는 추리소설을 읽었을 때, 보통 고전적인 형태의 추리소설은 270p쯤에서 진범이 밝혀진다. 명탐정이 280p까지 10p의 추리를 펼쳐 보이면 우리는 10p와 54p 그리고 182p에 있는 복선과 알리바이를 조합하며 경탄한다. ‘와, 이 추리 끝내주는데.’ 이러한 지적 노동과 사고가 가능한 것은 모두 당신의 기억력 덕분이다. 2시간 남짓한 시간에 한 권의 책 내용을 숙지하고 탐정의 추리가 펼쳐지는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 해당 내용을 끄집어낼 때 카타르시스가 폭발할 수 있다.
그러나 편당 연재, 결제되는 웹소설에선 이러한 구조가 불가능하다. 보통 웹소설 25편이 책 한 권 분량에 해당하니 웹소설에선 22편쯤 진범이 밝혀지리라. 그리고 3편의 알리바이를 떠올리기 위해선 19일의 기억을 거슬러야 한다. 게다가 웹소설의 독자들은 하루에 소설 한 편만을 읽지 않는다. 보통 10종 이상의 소설을 읽는 경우가 많고, 한 편의 독서 시간은 3~5분 내외이다. 즉 일반적인 웹소설의 독자가 하루에 10편의 소설을 읽는다고 가정할 때, 그는 그가 20일 동안 읽었던 200편, 8권의 소설 내용 중 3~5분 남짓을 투자해서 읽었던 한두 문단과 문장을 떠올리는 데 성공해야만 종이책으로 출간된 소설에서 구현되던 극적 아이러니와 구조적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웹소설은 완성된 소설을 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웹소설의 한 편 한 편은 자체적인 기승전결의 구조 속에서 ‘한 편’이라는 값어치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보통 소설이나 콘텐츠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주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끝났을 때 엔딩 무렵 독자에게 건네는 질문을 뜻한다. 그러나 웹소설의 독자는 매 편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러한 ‘주제’를 목격하는 일 자체가 드물다 보니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기존의 작법이나 스토리 구조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웹소설에 익숙한 창작자나 독자 입장에선 현재 시장에 나온 소설책이나 영화, 드라마의 호흡은 느리기 그지없게 느껴지고, 부차적인 이야기에 골몰해 매몰된 낡은 문법으로만 느껴진다.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독자는 드물다. 말했듯, 그건 웹소설과 영상 콘텐츠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영상 콘텐츠의 사람들은 서사를 이야기할 때 꼭 극적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걸까. 어쩌면 완성도를 운운하기 위해 웹소설은 젊은 세대, MZ들의 전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덕분에 나는 오늘도 웹소설 평론가라는 타이틀로 싸우며 글값을 버니 고마운 일이지만.
이융희는 웹소설 작가 겸 문화연구자다. <웹소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악인의 서사><웹소설 보는 법> 등의 책을 썼다.
Credit
- EDITOR 김현유
- WRITER 이융희
- ILLUSTRATOR MYCDAYS
- ART DESIGNER 주정화
CELEBRITY
#로몬, #차정우, #노재원, #진영, #A20, #솔로지옥, #tws, #카이, #kai, #아이브, #가을, #필릭스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