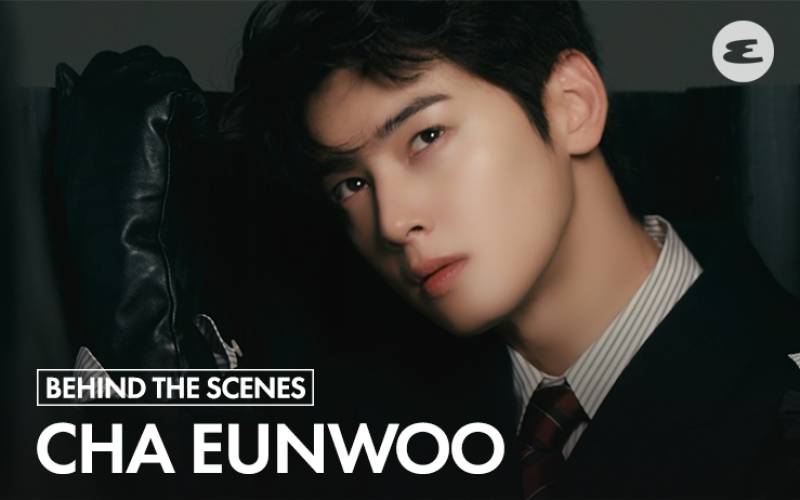STYLE
어그 부츠부터 스톤 아일랜드 비니로 채운 열다섯개의 방한용품
너와 함께라면 한겨울 추위도 두렵지 않아.
전체 페이지를 읽으시려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나는 유명한 겨울 아우터 유목민이었다. 코트 안에 겹겹이 껴입으면 몸이 둔탁해져서 별로였고, 둥실둥실한 패딩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 보머를 만나기 전까진 정말 그랬다. 누에고치라도 된 듯 봉긋하게 부풀어오른 R13 특유의 아방가르드함이 좋아서 산 이 보머는 이제 나의 피부가 되어버렸다. 여유 있는 품 덕에 움직임이 편안하고, 지퍼를 끝까지 채워 잠그면 야외 촬영도 문제없을 정도로 따뜻하다.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아우터다. - 모델 이요셉 @coldbloodbixch

어찌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작은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이 비니와 벌써 8년째 함께하고 있다. 전역과 동시에 군대에서의 모든 추억을 말끔히 정리했지만 이 꼬질꼬질한 모자만은 미처 정리하지 못했다. 두 번의 지옥 같은 동계훈련을 거치며 내 머리에 꼭 맞게 늘어난 녀석을 보고 있자니 얼핏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비니로 귀를 따뜻하게 감싼 다음 후디를 뒤집어쓰면 한겨울까지 무탈하다. - 푸드 아티스트 류경진 @jinjonjamforberry

나의 하루 일과는 디깅으로 시작해 디깅으로 끝난다. 아주 평범했던 어느 날 이 어그 부츠에서 스크롤이 멈췄다. 구름을 닮은 순수한 파스텔 블루 컬러와 물음표가 띄워지는 어그와 텔파의 만남. 로고 끝자락을 잡고 발을 구겨 넣는 순간의 폭신함을 상상해본다.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장난기 섞인 마음으로 산 이 부츠를 이제는 사랑하게 됐다. 조금 험하게 신으면 금세 더러워질 것 같아 아껴 신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됐다. - 케미컬 스포츠 디렉터 김상원 @chemical.sports

어릴 적부터 목을 감싸는 건 좋은 걸 사라고 배웠다. 유난히 목이 시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이 터틀넥을 덜컥 구매했다. 꽤나 비싼 가격대였지만 괜찮았다. 랄프 로렌 퍼플 라벨이니 질은 당연히 좋을 것 같았고, 보는 것만으로 따뜻해지는 새빨간 컬러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 옷을 입은 날이면 모두가 떡볶이 같은 걸 입었다며 한 마디씩 말을 얹고 지나간다. 그 기분도 썩 나쁘지 않다. - 에스콰이어 디지털 에디터 임일웅 @limilwoong

내게 겨울은 참 멋없는 계절이었다. 그런데 이 코트를 만난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 키드수퍼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화려한 생김새에 이끌려 무작정 집으로 데려온 지 2년. 애석하게도 이 코트를 입은 날을 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새것에 가깝지만, 낙엽이 채 다 떨어지기도 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서커스 같은 코트를 보며 올겨울은 많이 사용해보리라 다짐한다. 언젠가 호기롭게 이 코트를 걸칠 날을 상상한다. - 앤더슨벨 패션 프로덕트팀 임재현 @ropebetterthanthehope

자주 들르는 빈티지 숍에서 이 바지를 발견한 순간을 선명히 기억한다. ‘아, 누가 이런 바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던 모든 조건을 이 바지는 전부 갖추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워싱과 셰이프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적당한 고시감, 타탄체크 패턴 안감을 덧댄 완벽한 겨울 데님. 밑단을 살짝 접어 입고 거울을 본다. 저절로 캐럴이 흥얼거려진다.

어그 입문 3년. 이제 이 부츠 없이는 겨울을 지낼 용기가 없다. 얇지만 포근하게 발목을 감싸주는 3M 신슐레이트 소재의 패디드 칼러, 게다가 어찌나 가볍고 편안한지. 안쪽으로 도톰한 양말을 챙겨 신고 끈을 빈틈없이 꽉 묶으면 시린 바람이 쌩쌩 부는 눈밭 위에서도 발만은 이불을 덮은 것처럼 따스하다. - 더왈드 디렉터 박예준 @aimpiswandering

젊은 시절 밴드를 하셨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록 스피릿 덕에 나는 아주 당연하게도 에디 슬리먼을 좋아하는 아이가 됐다. 일본에 살던 열다섯쯤, 빈티지 숍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머플러를 사기 위해 먹지도, 놀지도 않고 몇 달치 용돈을 모았다. 투박한 머플러에서 느껴지는 에디 슬리먼 특유의 예민한 감성에 홀려 버린 거다. 이제는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이 녀석. 보풀은 일어날 대로 일어나버렸고 색도 많이 바랬지만 이 목도리를 겨울마다 꺼내 드는 건 그때의 순수한 열정을 잃고 싶지 않아서다. - 러브트레인 대표 최준희 @lovetrain.kr

스쿠터를 사고 처음 맞는 겨울은 생각보다 분주했다. 가장 먼저 윈드 스크린을 큼지막한 걸로 교체했고, 오직 기능만을 위한 발라클라바와 발열 조끼도 샀다. 125cc짜리 스쿠터 주인에게 가죽은 좀 느끼하고, 니트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이 귀여운 패딩 장갑까지 구비했다. 요즘은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난다. 포동포동 뽀얀 이 장갑이 내 스쿠터와 꼭 어울려서. - 에스콰이어 패션 에디터 성하영 @welcometotheshyworkroom

앤 드뮐미스터의 미학은 내게 가장 큰 영감이다. 그녀의 피스를 아카이빙하는 데 열심이던 시절, 일본의 한 빈티지 숍에서 이 후드 머플러를 발견했다. 어떻게 연출해도 이상하지 않은 독특한 형태와 인체를 타고 유연하게 흐르는 알파카 울의 질감. 내가 사랑하는 블랙, 정제된 성스러움. 내 겨울 가방에는 이 머플러가 늘 함께다. - 마인아카이브 대표 문일중 @mine_archive_shop

이 부츠가 좋은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순 명료하다. 예뻐서. 카키 빛 나일론과 브라운 레더의 조합, 발목을 튼튼하게 감싸는 스트랩, 그리고 내장된 다운 부티. 필드에서 더 빛을 발할 것 같은 생김새. 일본에 딱 하나 남아 있던 마지막 매물을 겨우 구했다. 어렵게 구한 만큼 소중하게 신는다. 오래오래 겨울마다 함께해야 하니까. - 에이프릴먼데이 디렉터 임승민 @amc.413

겨울에는 보온병을 들고 다니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방만 열면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사실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하나만 보고 이 보온병을 샀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철학까지 이해하게 됐다.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어떤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건 때때로 신념과 인생을 바꿀 만큼 큰일이다.

이 파카는 스톤 아일랜드의 정수를 집대성한 피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름처럼 유리 같이 빛나는 질감, 스톤 아일랜드만의 다잉과 워싱 공정을 거친 오묘한 색감, 얇게 누빈 패딩 위로 폴리우레탄 필름처리한 메시를 덧댄 기능적인 디자인. 무엇보다 2024 가을/겨울 캠페인에서 리암 갤러거가 입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게는 소장 가치가 충분했다. 바라만 봐도 든든하다.

2017 가을/겨울 시즌에 출시됐던 부드럽고 튼튼하고 도톰한 비니. 온도가 낮아지면 카키 빛을 띠고 온도가 높아지면 베이지 빛으로 변하는 열감응 원사를 사용해 매일, 매순간 처음 만나는 듯 새로운 느낌을 주는 녀석이다. 이 소재를 사용했던 제품들은 모두 스톤 아일랜드의 레전드 피스가 됐다. 뿌듯한 마음으로 혹독한 겨울마다 꺼내 든다. - 포토그래퍼 심재 @eztag_

지난해 겨울의 반 이상을 이 보드랍고 방실방실한 어썸니즈 더비 해트와 함께했다. 귀부터 뒷목까지 따뜻하게 감싸는 큼직한 사이즈는 말할 것도 없고, 얼굴처럼 보이는 패턴 덕에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이례적으로 긴 첫눈이 왔던 날 이 모자를 다시 찾았다. 올해도 잊지 않고 아껴줘야지. - 스타일리스트 오한슬 @o1ssl
Credit
- EDITOR 성하영
- PHOTOGRAPHER 김성중
- ART DESIGNER 주정화
CELEBRITY
#로몬, #차정우, #노재원, #진영, #A20, #솔로지옥, #tws, #카이, #kai, #아이브, #가을, #필릭스
이 기사도 흥미로우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에스콰이어의 최신소식